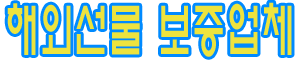'앙꼬 없는 찐빵'에 투자한 꼴, LG화학SK이노 주주들 '분통'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는 신설 법인 주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LG화학 주주들은 물적분할 후 상장되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분할된 자회사가 중복으로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기업 가치는 떨어진다.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개인들은 물적분할을 타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물적분할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하반기에만 11건 올라왔다.
문제는 이 자회사가 상장할 때다. 모회사 시총에 자회사의 가치가 이미 반영돼 있는데, 이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중복 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중공업 등이 잇따라 상장하면서 그 모회사인 SK, SK케미칼,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박스권에 갇힌 것도 그래서다. 배터리 사업을 분사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을 분사한 만도 등의 주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들 자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앙꼬 없는 찐빵’에 투자한 꼴이 됐다는 모회사 주주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자회사 상장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모회사 주주가 아니라 우리사주조합, 신주를 받은 투자자로 한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권리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는 다르다. 분할 발표 당시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을 두고 한 펀드매니저는 “물적분할에 대한 공포가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유지’와 ‘자금 조달’ 고민하는 기업
기업으로서도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LG는 LG화학 지분 30.06%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LG화학을 지배하고 있다. 만약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인적분할을 선택했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마찬가지로 ㈜LG가 30.06%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가 된다.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LG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위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자금 조달 과정에서 ㈜LG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줄어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은 대표 사례로 꼽히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B주의 의결권이 A주의 10배다. B주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80% 이상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유상증자로 직접 자금 조달을 해도 지배권이 흔들릴 위험이 없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국내 기업은 각종 제도를 고려했을 때 물적분할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